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정폭력 신고를 14차례나 접수받고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됐으며,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8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나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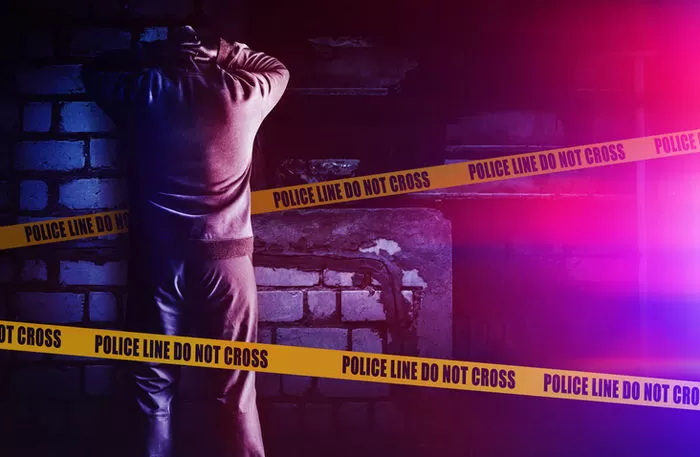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날 밤, 피해 여성은 방범 철조망을 뜯고 침입한 동거남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직무태만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4월 이를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신고자와 동거남이 가정 구성원 사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 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불문경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A씨가 현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살폈고, 폭행 흔적이 없어 가정폭력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세 차례 현장 출동을 통해 신고 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와 동거남의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타 고려 요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하였고, 112시스템 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가 속한 순찰 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