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Tube 'News Capital'
YouTube 'News Capital'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죽은 사람의 몸에 온갖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벌레가 시체를 파먹는 끔찍한 현장 주변에는 또 다른 해골들이 즐비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해골을 관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곳의 이름은 '시체 농장(Body Farm)'.
좀비 영화에만 등장할 것 같은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YouTube 'News Capital'
YouTube 'News Capital'
지난 15일(현지 시간) 유튜브 채널 'News Capital'은 죽은 사람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 농장'을 소개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시체농장의 정식 명칭은 '테네시대학교 인류학 연구소(University of Tennessee Anthropological Research Facility)'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시신을 들판에 놓아 다양한 환경에 노출한 뒤 시체의 부패 진행 상황을 관찰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시체의 부패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법의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YouTube 'News Capital'
YouTube 'News Capital'
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 되는 의학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학문이다.
이를 통해 시신의 정확한 사망 요인 및 사망 추정 시간을 밝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시체농장은 지난 1981년 윌리엄 배스(William M Bass) 박사의 구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시행 당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400구가 넘는 시신을 성공적으로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수많은 범죄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
 YouTube 'News Capital'
YouTube 'News Capital'
처음에 이곳에 오는 시신들은 대부분 무연고자였다.
하지만 시체농장을 소재로 한 소설이 발표되면서 현재는 100구 남짓한 시신이 기부되고 있다.
장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신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까다로운 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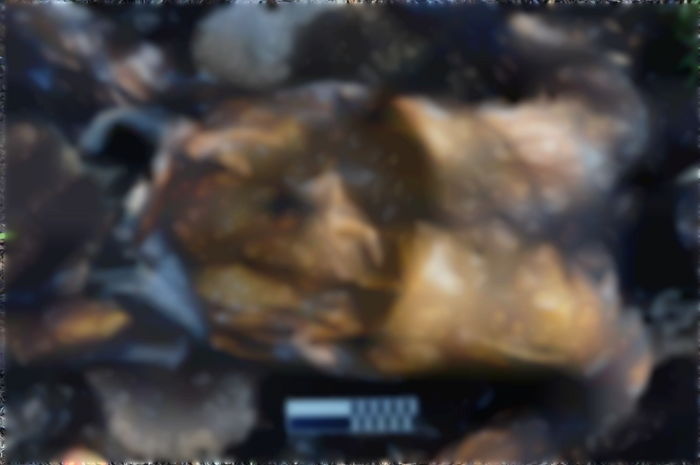 YouTube 'News Capital'
YouTube 'News Capital'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만 그들은 죽는 마지막 순간 다잉 메시지(Dying message)를 남겼을 뿐이다.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체 농장'은 죽은 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소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