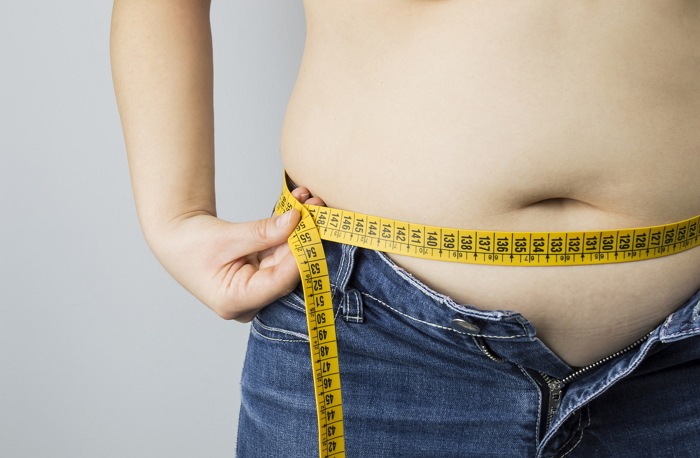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소득에 따른 비만 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 수준별 비만 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 수준 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 유병률 격차는 2015년 6.5%로 201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2010년의 경우 하위 25%의 비만 유병률(30.3%)은 상위 25%(32.3%)는 물론 국민 전체 평균(30.9%)보다도 낮았다. 유병률 격차 또한 마이너스였다.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하지만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31.8%)이 증가하더니 2012년 4.6%(34.7%), 2014년 5.1%(32.6%), 2015년 6.5%(37.2%)로 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반면 상위 25%는 2011년(29.9%)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는 비만 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2015년은 30.7%).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20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연동되는 사회 문제"라며 "소득에 따른 '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